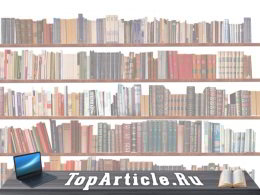아내는 혀깨물어 벙어리, 아들은 전투중 전사, 여천 홍범도 장군
#홍범도장군 #홍범도 #독립운동 #역사공부
죽음을 넘은 신념, 사랑을 꺾지 않은 이름들 – 홍범도 가족 이야기
1907년, 조선의 국권이 흔들리던 그해 겨울, 함경북도 북청에 사는 한 여인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그녀의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단양 이씨. 북청 출신의 젊은 여성이자, 대한의병장 홍범도의 아내였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다시 총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제의 타깃이 되었다.
일본군은 의병 활동을 막기 위해 가족을 협박 도구로 삼았다. 그들에게 단양 이씨는 단순한 ‘의병장의 아내’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편지를 쓰라 했다. “남편에게 투항을 권하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고문이 시작됐다. 발가락 사이에 기름먹인 솜을 끼우고 불을 붙였다.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계집이나 사나이나 영웅호걸이라도, 실 끝 같은 목숨은 없어지면 그뿐이다. 내가 설혹 그런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 맘대로 해라. 나는 아니 쓴다.”
그녀는 스스로 혀를 깨물며 말을 포기했고, 결국 벙어리가 된 채 갑산읍 옥에 갇혔다. 고문의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름조차 또렷이 남지 않은 이 여인은, 말 대신 신념으로 죽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편 홍범도가 1940년대에 남긴 『홍범도 일지』에 실려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홍범도는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을 30년 넘게 기억했다. 자신을 “영웅호걸”이라 불러주던 사람, 목숨을 버리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아마도 그 기억이, 이후 고단한 망명 생활과 외로운 말년을 견디게 한 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군은 멈추지 않았다. 아내를 굴복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그의 아들을 데려갔다. 당시 17세였던 첫째 아들 홍양순은 어머니와 함께 일본군에게 붙잡혀 압송됐다. 어머니는 옥중에서 죽고, 아들은 일본군에 포섭되어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달하라는 사명을 맡게 됐다. 그것은 마지막, 아홉 번째 사자였다.
편지를 들고 홍범도의 의병부대 앞에 나타난 양순. 그를 본 아버지는 즉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놈아! 네가 전 달에는 내 자식이었지마는, 네가 일본 감옥에 서너 달 갇혀 있더니, 그놈들 말을 듣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놈이 됐구나. 너부터 쏘아 죽여야겠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총탄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아들의 귀를 관통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는 죽지 않았다. 홍범도는 명사수였다. 공중에 던진 동전을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이었다. 눈앞의 아들을 빗맞혔다는 건, 고의였다.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 사령관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알을 맞은 아들 홍양순은 정신을 차렸다. 다시 아버지의 부대에 합류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중대장을 맡았고, 아버지와 함께 수차례 전투에 참전했다. 함흥, 갑산, 다랏치, 금광 전투 등에서 싸웠다.
1908년 6월 16일, 정평 바맥이 전투. 500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의병은 6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날, 중대장이었던 홍양순도 전사했다.
홍범도는 일지에 이렇게 남겼다.
“정평 바맥이에서 500명 일본군과 싸움하여 107명 살상하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이는 중대장이었다. 5월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울부짖지도, 슬픔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줄로 끝낸 그 문장에서, 한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밖에 없다.
아내는 고문으로 죽고, 아들은 전장에서 죽고, 남은 둘째 아들 홍용환은 8살로 외가에 맡겨졌지만 이후의 행방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홍범도의 가족은, 하나 둘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홍범도는 복수로 살지 않았다.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유인 도구로 삼은 친일 부역자 김원홍과 임재덕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두 놈은 내 말을 들어라. 김원홍 이놈! 네가 수년을 진위대 참령으로 국록을 수만원을 받아먹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시골에서 감자 농사하며 먹고사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의 도리이거든. 도리어 나라의 역적이 되니,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몹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임재덕도 너와 같이 사형에 다 처한다.”
그는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넘긴 죄를 벌했다. 이 판단과 처형조차 냉정하고 엄정했다. 그렇게 가족의 죽음조차, 자신의 신념에 매몰시키지 않았다.
10년간의 평화, 단양 이씨와 양순, 용환과 함께한 노은리의 그 시간이 무너진 1908년 이후, 홍범도는 다시 조선 땅을 밟지 못했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도, 품을 사람도, 안겨줄 이름도 없었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고려극장에서 수위장으로 일하며 생을 마감했다. 다시 사랑을 했지만, 첫 부인과 아들의 죽음은 평생 그의 심장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2021년, 그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왔다. 80년을 돌아, 조국의 품으로. 그러나 유해가 돌아온 지 2년도 안 되어, 흉상 철거 논란이 벌어졌다. 그가 살아서 지킨 이름과 죽어서도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 다시 싸움의 중심에 섰다.
홍범도의 가족사는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항일 투쟁의 비극을 상징한다. 아내 단양 이씨는 고문 속에서도 남편을 배신하지 않았고, 아들 홍양순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전장에서 목숨을 바쳤다. 홍범도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딛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그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의 초석이 되었다.
Видео 아내는 혀깨물어 벙어리, 아들은 전투중 전사, 여천 홍범도 장군 канала 그린비트
죽음을 넘은 신념, 사랑을 꺾지 않은 이름들 – 홍범도 가족 이야기
1907년, 조선의 국권이 흔들리던 그해 겨울, 함경북도 북청에 사는 한 여인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그녀의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단양 이씨. 북청 출신의 젊은 여성이자, 대한의병장 홍범도의 아내였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다시 총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제의 타깃이 되었다.
일본군은 의병 활동을 막기 위해 가족을 협박 도구로 삼았다. 그들에게 단양 이씨는 단순한 ‘의병장의 아내’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편지를 쓰라 했다. “남편에게 투항을 권하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고문이 시작됐다. 발가락 사이에 기름먹인 솜을 끼우고 불을 붙였다.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계집이나 사나이나 영웅호걸이라도, 실 끝 같은 목숨은 없어지면 그뿐이다. 내가 설혹 그런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 맘대로 해라. 나는 아니 쓴다.”
그녀는 스스로 혀를 깨물며 말을 포기했고, 결국 벙어리가 된 채 갑산읍 옥에 갇혔다. 고문의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름조차 또렷이 남지 않은 이 여인은, 말 대신 신념으로 죽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편 홍범도가 1940년대에 남긴 『홍범도 일지』에 실려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홍범도는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을 30년 넘게 기억했다. 자신을 “영웅호걸”이라 불러주던 사람, 목숨을 버리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아마도 그 기억이, 이후 고단한 망명 생활과 외로운 말년을 견디게 한 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군은 멈추지 않았다. 아내를 굴복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그의 아들을 데려갔다. 당시 17세였던 첫째 아들 홍양순은 어머니와 함께 일본군에게 붙잡혀 압송됐다. 어머니는 옥중에서 죽고, 아들은 일본군에 포섭되어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달하라는 사명을 맡게 됐다. 그것은 마지막, 아홉 번째 사자였다.
편지를 들고 홍범도의 의병부대 앞에 나타난 양순. 그를 본 아버지는 즉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놈아! 네가 전 달에는 내 자식이었지마는, 네가 일본 감옥에 서너 달 갇혀 있더니, 그놈들 말을 듣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놈이 됐구나. 너부터 쏘아 죽여야겠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총탄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아들의 귀를 관통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는 죽지 않았다. 홍범도는 명사수였다. 공중에 던진 동전을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이었다. 눈앞의 아들을 빗맞혔다는 건, 고의였다.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 사령관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알을 맞은 아들 홍양순은 정신을 차렸다. 다시 아버지의 부대에 합류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중대장을 맡았고, 아버지와 함께 수차례 전투에 참전했다. 함흥, 갑산, 다랏치, 금광 전투 등에서 싸웠다.
1908년 6월 16일, 정평 바맥이 전투. 500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의병은 6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날, 중대장이었던 홍양순도 전사했다.
홍범도는 일지에 이렇게 남겼다.
“정평 바맥이에서 500명 일본군과 싸움하여 107명 살상하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이는 중대장이었다. 5월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울부짖지도, 슬픔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줄로 끝낸 그 문장에서, 한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밖에 없다.
아내는 고문으로 죽고, 아들은 전장에서 죽고, 남은 둘째 아들 홍용환은 8살로 외가에 맡겨졌지만 이후의 행방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홍범도의 가족은, 하나 둘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홍범도는 복수로 살지 않았다.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유인 도구로 삼은 친일 부역자 김원홍과 임재덕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두 놈은 내 말을 들어라. 김원홍 이놈! 네가 수년을 진위대 참령으로 국록을 수만원을 받아먹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시골에서 감자 농사하며 먹고사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의 도리이거든. 도리어 나라의 역적이 되니,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몹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임재덕도 너와 같이 사형에 다 처한다.”
그는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넘긴 죄를 벌했다. 이 판단과 처형조차 냉정하고 엄정했다. 그렇게 가족의 죽음조차, 자신의 신념에 매몰시키지 않았다.
10년간의 평화, 단양 이씨와 양순, 용환과 함께한 노은리의 그 시간이 무너진 1908년 이후, 홍범도는 다시 조선 땅을 밟지 못했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도, 품을 사람도, 안겨줄 이름도 없었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고려극장에서 수위장으로 일하며 생을 마감했다. 다시 사랑을 했지만, 첫 부인과 아들의 죽음은 평생 그의 심장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2021년, 그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왔다. 80년을 돌아, 조국의 품으로. 그러나 유해가 돌아온 지 2년도 안 되어, 흉상 철거 논란이 벌어졌다. 그가 살아서 지킨 이름과 죽어서도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 다시 싸움의 중심에 섰다.
홍범도의 가족사는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항일 투쟁의 비극을 상징한다. 아내 단양 이씨는 고문 속에서도 남편을 배신하지 않았고, 아들 홍양순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전장에서 목숨을 바쳤다. 홍범도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딛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그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의 초석이 되었다.
Видео 아내는 혀깨물어 벙어리, 아들은 전투중 전사, 여천 홍범도 장군 канала 그린비트
Комментарии отсутствуют
Информация о видео
6 июля 2025 г. 14:30:34
00:00:54
Другие видео канал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