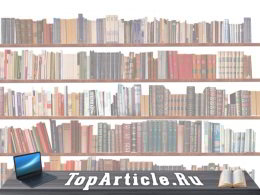여야 엇박자에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은 ‘계류 중’ / KBS 2024.05.07.
[앵커]
국내 첫 원전 해체 관련 강예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 기자, 결국,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원전 해체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후핵연료를 둘 영구처분장 건립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기자]
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려면 관련 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그 법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21대 국회가 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됩니다.
여야 모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마련과 영구처분장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전 터 안의 저장시설 용량이나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용량을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원전 입장인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 놓자, 이런 입장이고요.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보이는데,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공포돼도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바로 당장,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부는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장 확보를 목표로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중간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두는 문제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구처분장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지역 사회의 더 큰 반대가 예상됩니다.
영구처분장 건립 논의는 3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과거 정부의 논의 과정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부에서 영구처분장 터 선정을 시도했고, 아홉 차례나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하나같이 다 실패했거든요.
공론화 과정도 두 차례나 거쳤지만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어디에다 영구처분장을 둘 수 있을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은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인데,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부산시민들이 사용후핵연료를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현재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마련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내에 중간 건식 저장시설을 두는 건데, 지금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등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내용 중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둔 법안 내용이 부산으로선 독소 조항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처분장을 유치할 곳을 찾기 어려워서, 결국, 계속 원전 부지 안에 폐기물이 쌓여 보관하는 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지금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은 그야말로 모두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사용후핵연료는 반드시 영구처분장에 보관돼야 하는데요.
20개가 넘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80% 정도 들어차 있고, 2030년이면 대부분 포화상태에 달하게 됩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은 이미 시작해도 늦은 논의인데요.
원전 해체까지 본격화되는 만큼 국가적으로 또 정치권, 지역사회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강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Видео 여야 엇박자에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은 ‘계류 중’ / KBS 2024.05.07. канала KBS 뉴스 부산
국내 첫 원전 해체 관련 강예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 기자, 결국,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원전 해체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후핵연료를 둘 영구처분장 건립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기자]
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려면 관련 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그 법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21대 국회가 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됩니다.
여야 모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마련과 영구처분장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전 터 안의 저장시설 용량이나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용량을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원전 입장인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 놓자, 이런 입장이고요.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보이는데,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공포돼도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바로 당장,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부는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장 확보를 목표로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중간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두는 문제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구처분장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지역 사회의 더 큰 반대가 예상됩니다.
영구처분장 건립 논의는 3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과거 정부의 논의 과정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부에서 영구처분장 터 선정을 시도했고, 아홉 차례나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하나같이 다 실패했거든요.
공론화 과정도 두 차례나 거쳤지만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어디에다 영구처분장을 둘 수 있을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은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인데,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부산시민들이 사용후핵연료를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현재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마련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내에 중간 건식 저장시설을 두는 건데, 지금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등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내용 중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둔 법안 내용이 부산으로선 독소 조항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처분장을 유치할 곳을 찾기 어려워서, 결국, 계속 원전 부지 안에 폐기물이 쌓여 보관하는 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지금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은 그야말로 모두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사용후핵연료는 반드시 영구처분장에 보관돼야 하는데요.
20개가 넘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80% 정도 들어차 있고, 2030년이면 대부분 포화상태에 달하게 됩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은 이미 시작해도 늦은 논의인데요.
원전 해체까지 본격화되는 만큼 국가적으로 또 정치권, 지역사회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강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Видео 여야 엇박자에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은 ‘계류 중’ / KBS 2024.05.07. канала KBS 뉴스 부산
Комментарии отсутствуют
Информация о видео
7 мая 2024 г. 16:00:23
00:05:10
Другие видео канала

![[LIVE] KBS 뉴스7 부산 - 2025.07.15(화)](https://i.ytimg.com/vi/hBxACRx3NjY/default.jpg)

![[LIVE] KBS 뉴스7 부산 - 2025.07.16(수)](https://i.ytimg.com/vi/o-XEnr6hFxA/default.jpg)
![[LIVE] KBS 뉴스9 부산 - 2025.07.16(수)](https://i.ytimg.com/vi/fecpjEgkro4/default.jpg)
![[날씨] 부·울·경 내일까지 10~40mm 비…안전 사고 유의 / KBS 2025.07.14.](https://i.ytimg.com/vi/rtfekEn9rkE/default.jpg)
![[LIVE] KBS 뉴스7 부산 - 2025.07.14(월)](https://i.ytimg.com/vi/FwwQ7ySnMi0/default.jpg)
![[LIVE] KBS 930뉴스 부산 - 2025.07.14(월)](https://i.ytimg.com/vi/AJsbIwowd38/default.jpg)


![[3분 법률] 시간 지나면 끝?…기억해야 할 ‘시효’ / KBS 2025.07.14.](https://i.ytimg.com/vi/2SdjTtaF8eM/default.jpg)


![[LIVE] KBS 930뉴스 부산 - 2025.07.16(수)](https://i.ytimg.com/vi/xpXlYiCSMaY/default.jpg)
![[LIVE] K토크 부산 - 부산 화재 참변, 돌봄 강화 대책은?_250711_203회](https://i.ytimg.com/vi/_azFGiBBSxs/default.jpg)

![[LIVE] KBS 930뉴스 부산 - 2025.07.11(금)](https://i.ytimg.com/vi/YOPiM5oiqLA/default.jpg)
![[LIVE] KBS 뉴스9 부산 - 2025.07.13(일)](https://i.ytimg.com/vi/3qFoV5Z_TB0/default.jpg)
![[LIVE] KBS 930뉴스 부산 - 2025.07.15(화)](https://i.ytimg.com/vi/E67l9cgSoe8/default.jpg)

![[현장영상] 2025년 전반기, 롯데자이언츠와 함께한 팬들의 기록 / KBS](https://i.ytimg.com/vi/cWtRBLlJq58/default.jpg)
![[키워드이슈] 지진 / KBS 2025.07.16.](https://i.ytimg.com/vi/pCgP4oIfEDM/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