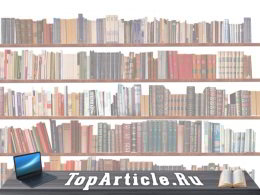경기무악 中 도당굿 부분 모음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13
음반명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13 경기무악
음반번호 : KICP-031 ~ 034 (CD 4 매)
제작/기획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작시기 : 1974
발매시기 : 2000
도당굿 부분 모음
00:00 장승막이
02:19 취타
03:55 허벌림
06:49 손굿
11:18 군응굿
16:15 긴쇠
19:34 뒷전
글 : 이자균(한국민속연구소)
Ⅵ. 장단 구성
1. 마을굿
마을굿에서 쓰이는 장단과 집굿에서 쓰이는 음악이 같지만 이를 편의상 구분하였다.
⑴ 도살풀이 : 일명 “섭채” 라고도 하며 무가를 얹어서 부를 경우에는 “오니 섭채” 라고 하며 6박이다.
⑵ 모리 : 도살풀이 장단에 이어서 연주하는 장단이며 12박이다. 도살풀이와 더불어 경기도 도당굿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장단이다.
⑶ 덩덕궁이 : 도살풀이 다음에 모리를 치고 춤을 추거나 수비를 칠 경우, 잔재비를 할 경우에 연주하며 12박이다.
⑷ 부정놀이 : 제석굿, 군웅굿에 맨 처음 나오는 장단이며 타악기로 편성하여 반주한다.
⑸ 진쇠 : 군웅굿에 나오며 남자인 선학습꾼과 여자가 對舞를 하는 수도 있다. 10박이고 부정놀이 다음에 치며 드문 장단이다.
⑹ 터벌림 : 일명 반설음 장단이라고 하며 “공삼현” 이나 손굿에 나오며 15박으로 꼽는다.
⑺ 가래조 : 군웅굿에 쓰이며 매우 드문 장단이며 10박이다.
⑻ 겹마치 : 올림채 뒤에 치기도 하고 터벌림 뒤에 치기도 하는데 4박이다.
⑼ 넘김채 : 어느 장단에서 다음 장단으로 넘어 갈 적에 치는 일종의 경과음이며 올림채 뒤에 친다.
2. 집굿
⑴ 푸살 : 새성주굿에 쓰이며 매우 드문 장단이며 보통의 15박이다.
⑵ 가래조 : 조상굿에 쓰이며 “중두박산 서겨온 마누라 신청 전물로 나리오” 하며 사설에서도 나오듯 일명 “중두박산” 가락이라고 하며 엇모리 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불가에서 재를 지낼 적에 “화청”을 친다. 서울의 쌍괘새남에서 쓰이는 “중디가락” 은 사설이나 장단 측면에서 볼 적에 이 가래조 장단과 전혀 다른 장단이다.
Ⅷ. 연주인 약력
1. 이용우(1899~1987)
이용우는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성호면 부산리에서 도당굿의 선학습꾼으로서는 출중한 기량을 지닌 이종하의 장자로 태어났다. 젊었을 적에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도당굿에 쓰이는 학습을 익혔으며 한때는 협률사가 해체되자 창극단을 좇아서 지방으로 순회 공연을 그의 부친 종하와 다니다가 해산을 하자 집으로 되돌아 와서 다시 학습을 하였다. 서모인 박금초한테 바탕 소리를 익힌 가운데 서울로 상경을 하여 단성사 등지에서 공연도 하였다고 한다. 대금은 평택군 청궁면 양감리의 김부억쇠(본명 : 미상)한테 풍류 한바탕과 삼현, 시나위를 익혔다고 한다. 김부억쇠는 나이로 봐서 이용우의 조부뻘 쯤 되는 이었다고 한다. 이용우는 경기도에서 세습적으로 국악을 한 집안의 후손답게 음악에 재주가 빼어나서 경기도 일판의 도당굿 가운데 가장 큰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군웅굿이나 손님굿, 뒷전 등을 맡아서 활동을 하였는데 대쪽같은 성미만큼이나 목구성이 우렁차고 또한 굿에서 쓰이는 문서가 다른 이들보다도 많아서 그 높은 기량을 자랑하였다. 어찌 보면 이용우가 경기도 도당굿의 선학습꾼으로서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이 음반에서 연주한 나이가 76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김” 이나 “가락” 이 젊은 사람들이 흉내조차 못낼 정도로 그 재주가 빼어나며 소리 역시 사설이 바뀌면 바뀐 대로 성음을 달리하여 방창 하는 것을 보면 불세출의 명인임을 알 수가 있으며 이용우한테 배운 이는 오수복(현 경기도 도당굿 제98호 기예능 보유자)이 있고 방인근(현 경기도 도당굿 전수조교)이 있다. 오수복은 군웅춤이나 제석춤을 배웠고 방인근은 장단과 가락을 재학습을 하였다.
2. 이충선(1900~1989)
이충선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몽촌에서 역시 국악을 한 이덕재의 둘째로 태어났다. 형인 일선도 피리, 해금에 명인이었고 동생인 달선은 해금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일찍이 상경을 하여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양금 풍류를 배웠으며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 마을에서 난 피리와 해금의 명인 양경원(계원)한테 피리 삼현과 풍류, 시나위를 익혔고 대금은 당시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에 살았던 경기도 평택읍 이충동 태생 대금의 명인 방화준한테 대금 풍류와 삼현, 시나위를 익혔다. 거문고만 제외하고 두루 악기에 능한 이였으며 일제 시대에는 경성 방송국에 출연하여 연주를 하기도 했으며 소리와 북, 장구에 능통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태생 김성준의 장자인 김광채, 그리고 대금의 명인 광식, 시흥군 수암면 와리에서 난 줄타기의 명인 이정업과는 처남 매부지간으로서 해방 이후로 오십 년대 중반부터 민속 악단을 조직하여 많은 활동을 한 국악인이었으며 송파산대놀이 피리 보유자로 있다가 작고하였고 이의 문하에서 많은 중견 국악인들이 나왔다.
3. 지갑성(1911~1980)
지갑성은 인천에서 났으나 십 오세 정도에는 수원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주해 살기도 하였다. 이후로 상경을 하여 국악을 하는 이들과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대로 국악을 한 장구와 선학습의 명인인 평택 태생 오강산(1870~195?, 본명 : 현숙, 선숙) 한테 무속 장단을 배웠으며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태생 이치문(1871~1939)한테 다시 장구도 배우고 선학습 문서를 배우기도 하였는데 이치문은 두 번째 스승이다. 오강산은 평택에서 살다가 사회적 신분 차별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척이 있는 지금의 인천시 경서동에 자리잡으면서 국악을 하였다. 이치문의 문하에서 현재 인천 삼현육각 장구 보유자인 이영수(본명 : 영만)도 이웃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무악 장구와 삼현, 풍류를 익혔다 한다. 지갑성의 집안들은 주로 안산에 많이 세거하는데 갑성이 독자로 태어나서 집안에서는 공부를 시키려고 했으나 갑성이 뜻이 없어 하지 않느 바람에 단념하고 국악에 더 소질을 보여서 배우게 하였다 한다. 지갑성의 부친은 그 마을의 훈장을 한 비국악인이었고 종조부가 피리, 해금, 장구를 다루었다한다.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지갑성의 사설은 오강산본과 이치문본이 섞여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이용우가 부른 사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서울에 와서는 단체를 만들어 다니는 바람에 단원들과 돌면서 구경꾼을 모으기 위해서 소리가 큰 태평소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주전공은 아니고 피리와 해금을 양경원한테 익혔는데 삼현, 풍류, 시나위를 이수하고 대금 풍류, 삼현, 시나위는 방용현한테 익혔다. 왕십리에 있는 광무대 극장에서 십 년간 장구 악사로 있기도 하였으며 이 바람에 한동안 도당굿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지갑성은 음악에 빼어난 재주가 있어서 무악 장단이나 풍류 한바탕을 칠 적에 조에 안 맞는 가락은 잘 안 치는 이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장구 가락과 때로는 겹가락을 유효 적절하게 넣어서 치는 장구 반주는 본인의 재주도 놀랍지만 이의 스승의 그늘이 짙다.
4. 임선문(1913~1987)
임선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황계리 184번지에서 임선달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아명은 선준으로 불린다. 부모들도 무속 음악에 명인이었고 이들의 안태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이며 대대로 국악을 한 집안이다. 열 여덟 무렵에 화성군 송산면 봉가리 16번지에서 난 피리, 해금, 소리, 장구에 명인 장만용(?~?)의 둘째 아들인 성순(1892~1941)의 문하로 들어가서 해금 풍류와 삼현, 시나위를 십여년간을 익힌 해금의 명인이다. 이십대 중반에는 마을에서 두레가 나면 상쇠로도 이름을 드날린 이이기도 한데 소리는 목 성음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해금으로만 종사한 이인데 스승인 성순은 경기도 시흥, 안산, 남양, 평택, 수원, 용인군 일대에 해금 악사를 많이 배출하였다. 본디 장성순의 부친 만용은 아산군 신창면 사람으로 구한말 때에 용인군 매탄리(지금의 수원시 매탄동)로 국악을 한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는 것이 마뜩찮아서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이곳으로 권솔을 이끌고 이사를 왔다고 한다. 장만용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가 점학이고 이는 대금 풍류, 삼현, 시나위, 소리에 능했고 춤과 장구, 발탈을 했던 故 이동안(1906~1995)도 이 수하에서 대금을 배웠다. 둘째인 성순은 다른 악기도 물론 다룰 줄 알았지만 해금 시나위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못 따라 갈 빼어난 재주를 지녔다한다. 임선문의 해금 줄은 너무 팽팽하게 조여놓아서 웬만한 손아귀힘으로는 잡지도 못했을 뿐더러 해금 깨나 한다는 이들도 “김” 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손도 대지도 못했다. 이의 스승인 성순이 늘 해금 줄을 팽팽하게 조여 놓아서 아마도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어디를 가든 해금은 시종여일하게 성순이 잡았고 이것이 버릇이 되어서 임선문도 굿청에 가거나 풍류를 하는데 가면 해금을 잡았다. 지금 경기도 도당굿에서 해금 악사가 없는 마당에 임선문의 해금 시나위와 삼현은 매우 주요한 자료가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삼현육각 편성으로 세습무들이 하는 지역은 해금 악사가 모두 작고하여 해금 가락은 전승이 단절되었음을 볼 적에 임선문이 녹음한 이 음반은 경기도 도당굿에서 쓰이는 무속 음악을 되살리는 데 더 없는 귀중한 음향 자료이다. 임선문은 아깝게도 제자를 양성을 못하고 작고를 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Видео 경기무악 中 도당굿 부분 모음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13 канала 각퇴요정
음반번호 : KICP-031 ~ 034 (CD 4 매)
제작/기획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작시기 : 1974
발매시기 : 2000
도당굿 부분 모음
00:00 장승막이
02:19 취타
03:55 허벌림
06:49 손굿
11:18 군응굿
16:15 긴쇠
19:34 뒷전
글 : 이자균(한국민속연구소)
Ⅵ. 장단 구성
1. 마을굿
마을굿에서 쓰이는 장단과 집굿에서 쓰이는 음악이 같지만 이를 편의상 구분하였다.
⑴ 도살풀이 : 일명 “섭채” 라고도 하며 무가를 얹어서 부를 경우에는 “오니 섭채” 라고 하며 6박이다.
⑵ 모리 : 도살풀이 장단에 이어서 연주하는 장단이며 12박이다. 도살풀이와 더불어 경기도 도당굿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장단이다.
⑶ 덩덕궁이 : 도살풀이 다음에 모리를 치고 춤을 추거나 수비를 칠 경우, 잔재비를 할 경우에 연주하며 12박이다.
⑷ 부정놀이 : 제석굿, 군웅굿에 맨 처음 나오는 장단이며 타악기로 편성하여 반주한다.
⑸ 진쇠 : 군웅굿에 나오며 남자인 선학습꾼과 여자가 對舞를 하는 수도 있다. 10박이고 부정놀이 다음에 치며 드문 장단이다.
⑹ 터벌림 : 일명 반설음 장단이라고 하며 “공삼현” 이나 손굿에 나오며 15박으로 꼽는다.
⑺ 가래조 : 군웅굿에 쓰이며 매우 드문 장단이며 10박이다.
⑻ 겹마치 : 올림채 뒤에 치기도 하고 터벌림 뒤에 치기도 하는데 4박이다.
⑼ 넘김채 : 어느 장단에서 다음 장단으로 넘어 갈 적에 치는 일종의 경과음이며 올림채 뒤에 친다.
2. 집굿
⑴ 푸살 : 새성주굿에 쓰이며 매우 드문 장단이며 보통의 15박이다.
⑵ 가래조 : 조상굿에 쓰이며 “중두박산 서겨온 마누라 신청 전물로 나리오” 하며 사설에서도 나오듯 일명 “중두박산” 가락이라고 하며 엇모리 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불가에서 재를 지낼 적에 “화청”을 친다. 서울의 쌍괘새남에서 쓰이는 “중디가락” 은 사설이나 장단 측면에서 볼 적에 이 가래조 장단과 전혀 다른 장단이다.
Ⅷ. 연주인 약력
1. 이용우(1899~1987)
이용우는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성호면 부산리에서 도당굿의 선학습꾼으로서는 출중한 기량을 지닌 이종하의 장자로 태어났다. 젊었을 적에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도당굿에 쓰이는 학습을 익혔으며 한때는 협률사가 해체되자 창극단을 좇아서 지방으로 순회 공연을 그의 부친 종하와 다니다가 해산을 하자 집으로 되돌아 와서 다시 학습을 하였다. 서모인 박금초한테 바탕 소리를 익힌 가운데 서울로 상경을 하여 단성사 등지에서 공연도 하였다고 한다. 대금은 평택군 청궁면 양감리의 김부억쇠(본명 : 미상)한테 풍류 한바탕과 삼현, 시나위를 익혔다고 한다. 김부억쇠는 나이로 봐서 이용우의 조부뻘 쯤 되는 이었다고 한다. 이용우는 경기도에서 세습적으로 국악을 한 집안의 후손답게 음악에 재주가 빼어나서 경기도 일판의 도당굿 가운데 가장 큰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군웅굿이나 손님굿, 뒷전 등을 맡아서 활동을 하였는데 대쪽같은 성미만큼이나 목구성이 우렁차고 또한 굿에서 쓰이는 문서가 다른 이들보다도 많아서 그 높은 기량을 자랑하였다. 어찌 보면 이용우가 경기도 도당굿의 선학습꾼으로서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이 음반에서 연주한 나이가 76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김” 이나 “가락” 이 젊은 사람들이 흉내조차 못낼 정도로 그 재주가 빼어나며 소리 역시 사설이 바뀌면 바뀐 대로 성음을 달리하여 방창 하는 것을 보면 불세출의 명인임을 알 수가 있으며 이용우한테 배운 이는 오수복(현 경기도 도당굿 제98호 기예능 보유자)이 있고 방인근(현 경기도 도당굿 전수조교)이 있다. 오수복은 군웅춤이나 제석춤을 배웠고 방인근은 장단과 가락을 재학습을 하였다.
2. 이충선(1900~1989)
이충선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몽촌에서 역시 국악을 한 이덕재의 둘째로 태어났다. 형인 일선도 피리, 해금에 명인이었고 동생인 달선은 해금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일찍이 상경을 하여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양금 풍류를 배웠으며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 마을에서 난 피리와 해금의 명인 양경원(계원)한테 피리 삼현과 풍류, 시나위를 익혔고 대금은 당시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에 살았던 경기도 평택읍 이충동 태생 대금의 명인 방화준한테 대금 풍류와 삼현, 시나위를 익혔다. 거문고만 제외하고 두루 악기에 능한 이였으며 일제 시대에는 경성 방송국에 출연하여 연주를 하기도 했으며 소리와 북, 장구에 능통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태생 김성준의 장자인 김광채, 그리고 대금의 명인 광식, 시흥군 수암면 와리에서 난 줄타기의 명인 이정업과는 처남 매부지간으로서 해방 이후로 오십 년대 중반부터 민속 악단을 조직하여 많은 활동을 한 국악인이었으며 송파산대놀이 피리 보유자로 있다가 작고하였고 이의 문하에서 많은 중견 국악인들이 나왔다.
3. 지갑성(1911~1980)
지갑성은 인천에서 났으나 십 오세 정도에는 수원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주해 살기도 하였다. 이후로 상경을 하여 국악을 하는 이들과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대로 국악을 한 장구와 선학습의 명인인 평택 태생 오강산(1870~195?, 본명 : 현숙, 선숙) 한테 무속 장단을 배웠으며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태생 이치문(1871~1939)한테 다시 장구도 배우고 선학습 문서를 배우기도 하였는데 이치문은 두 번째 스승이다. 오강산은 평택에서 살다가 사회적 신분 차별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척이 있는 지금의 인천시 경서동에 자리잡으면서 국악을 하였다. 이치문의 문하에서 현재 인천 삼현육각 장구 보유자인 이영수(본명 : 영만)도 이웃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무악 장구와 삼현, 풍류를 익혔다 한다. 지갑성의 집안들은 주로 안산에 많이 세거하는데 갑성이 독자로 태어나서 집안에서는 공부를 시키려고 했으나 갑성이 뜻이 없어 하지 않느 바람에 단념하고 국악에 더 소질을 보여서 배우게 하였다 한다. 지갑성의 부친은 그 마을의 훈장을 한 비국악인이었고 종조부가 피리, 해금, 장구를 다루었다한다.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지갑성의 사설은 오강산본과 이치문본이 섞여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이용우가 부른 사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서울에 와서는 단체를 만들어 다니는 바람에 단원들과 돌면서 구경꾼을 모으기 위해서 소리가 큰 태평소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주전공은 아니고 피리와 해금을 양경원한테 익혔는데 삼현, 풍류, 시나위를 이수하고 대금 풍류, 삼현, 시나위는 방용현한테 익혔다. 왕십리에 있는 광무대 극장에서 십 년간 장구 악사로 있기도 하였으며 이 바람에 한동안 도당굿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지갑성은 음악에 빼어난 재주가 있어서 무악 장단이나 풍류 한바탕을 칠 적에 조에 안 맞는 가락은 잘 안 치는 이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장구 가락과 때로는 겹가락을 유효 적절하게 넣어서 치는 장구 반주는 본인의 재주도 놀랍지만 이의 스승의 그늘이 짙다.
4. 임선문(1913~1987)
임선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황계리 184번지에서 임선달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아명은 선준으로 불린다. 부모들도 무속 음악에 명인이었고 이들의 안태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이며 대대로 국악을 한 집안이다. 열 여덟 무렵에 화성군 송산면 봉가리 16번지에서 난 피리, 해금, 소리, 장구에 명인 장만용(?~?)의 둘째 아들인 성순(1892~1941)의 문하로 들어가서 해금 풍류와 삼현, 시나위를 십여년간을 익힌 해금의 명인이다. 이십대 중반에는 마을에서 두레가 나면 상쇠로도 이름을 드날린 이이기도 한데 소리는 목 성음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해금으로만 종사한 이인데 스승인 성순은 경기도 시흥, 안산, 남양, 평택, 수원, 용인군 일대에 해금 악사를 많이 배출하였다. 본디 장성순의 부친 만용은 아산군 신창면 사람으로 구한말 때에 용인군 매탄리(지금의 수원시 매탄동)로 국악을 한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는 것이 마뜩찮아서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이곳으로 권솔을 이끌고 이사를 왔다고 한다. 장만용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가 점학이고 이는 대금 풍류, 삼현, 시나위, 소리에 능했고 춤과 장구, 발탈을 했던 故 이동안(1906~1995)도 이 수하에서 대금을 배웠다. 둘째인 성순은 다른 악기도 물론 다룰 줄 알았지만 해금 시나위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못 따라 갈 빼어난 재주를 지녔다한다. 임선문의 해금 줄은 너무 팽팽하게 조여놓아서 웬만한 손아귀힘으로는 잡지도 못했을 뿐더러 해금 깨나 한다는 이들도 “김” 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손도 대지도 못했다. 이의 스승인 성순이 늘 해금 줄을 팽팽하게 조여 놓아서 아마도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어디를 가든 해금은 시종여일하게 성순이 잡았고 이것이 버릇이 되어서 임선문도 굿청에 가거나 풍류를 하는데 가면 해금을 잡았다. 지금 경기도 도당굿에서 해금 악사가 없는 마당에 임선문의 해금 시나위와 삼현은 매우 주요한 자료가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삼현육각 편성으로 세습무들이 하는 지역은 해금 악사가 모두 작고하여 해금 가락은 전승이 단절되었음을 볼 적에 임선문이 녹음한 이 음반은 경기도 도당굿에서 쓰이는 무속 음악을 되살리는 데 더 없는 귀중한 음향 자료이다. 임선문은 아깝게도 제자를 양성을 못하고 작고를 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Видео 경기무악 中 도당굿 부분 모음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13 канала 각퇴요정
Комментарии отсутствуют
Информация о видео
9 июня 2023 г. 17:00:44
00:23:14
Другие видео канала




![아악이란 무엇인가 [감상하며 설명듣는]](https://i.ytimg.com/vi/-_pK0DHCU3g/default.jpg)
![민요모음곡(소리샘 예술제 1일차) [2022학년도 결산 04] @nationalgugakmiddleschool](https://i.ytimg.com/vi/2yeYxa8UPlk/default.jpg)
![정간보란 무엇인가 (2) (용어, 박자) [이론이 어려워? 이론 이론~ 27편]](https://i.ytimg.com/vi/adSqWDGjhGc/default.jpg)
![3학년 합주[피리 용]](https://i.ytimg.com/vi/B4zBA8w_GJ8/default.jpg)



![민요모음곡(광주 지방공연) [2022학년도 결산 09] @nationalgugakmiddleschool](https://i.ytimg.com/vi/pCw0gHk9ggQ/default.jpg)



![우조 이수대엽 [소남 이주환 선생 30주기 추모기념음반 이주환 가곡 가사]](https://i.ytimg.com/vi/g0hNiYJbIhk/default.jpg)
![음계란 무엇인가 (3) [이론이 어려워? 이론 이론~ 11편]](https://i.ytimg.com/vi/ux_xYqmUJVo/default.jpg)
![[1정 66] 수요남극(취타) 수업시간 반복연습용](https://i.ytimg.com/vi/RaRca_ywR9g/default.jpg)


![[속도 1정 62] 수업시간에 도드리 반복연습용](https://i.ytimg.com/vi/W0HJhHbAVXU/default.jpg)